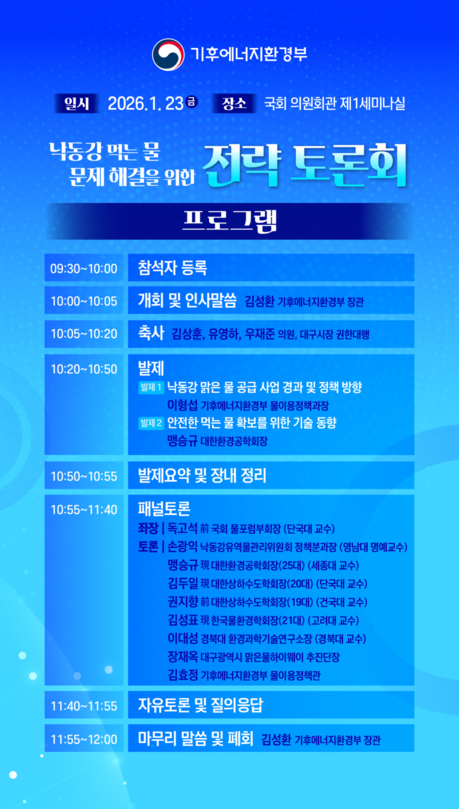급등하는 아파트 값으로 정국이 시끌시끌하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안정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다.
우선 양쪽이 제시하는 통계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통계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서울의 전체 주택 상승률을 집계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14.2%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수치는 57.6%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다.
이에 대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실련이 인용한 KB주택가격동향은 거래가 된 아파트 중심으로 집계가 됐다면 한국감정원 통계는 거래가 안 되는 주택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두 통계가 내놓은 수치의 괴리감은 지나치게 간극이 넓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감정원의 통계수치는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2%만 올랐다는 것은 실제 체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한국감정원이 집을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집의 시가총액 가중치를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인 평균치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통계방식은 10억원짜리 집과 1억원짜리 집이 각각 50%, 0% 상승했다면 소비재이므로 단순 합산을 통해 평균 집값 상승률을 25%((50+0)/2)로 잡는다. 이에 비해 집을 자산으로 보고 시가총액 가중치를 적용한다면 총 집값은 11억원에서 16억원(15+1)으로 뛴 것이므로 상승률은 45%에 달한다.
이상한 것은 한국감정원은 집을 소비재로 분류하고 이같은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고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유는 대분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시대로 시가총액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률이 대폭 낮아지고, 정부는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디에코. 무단전재-재배포 금지]